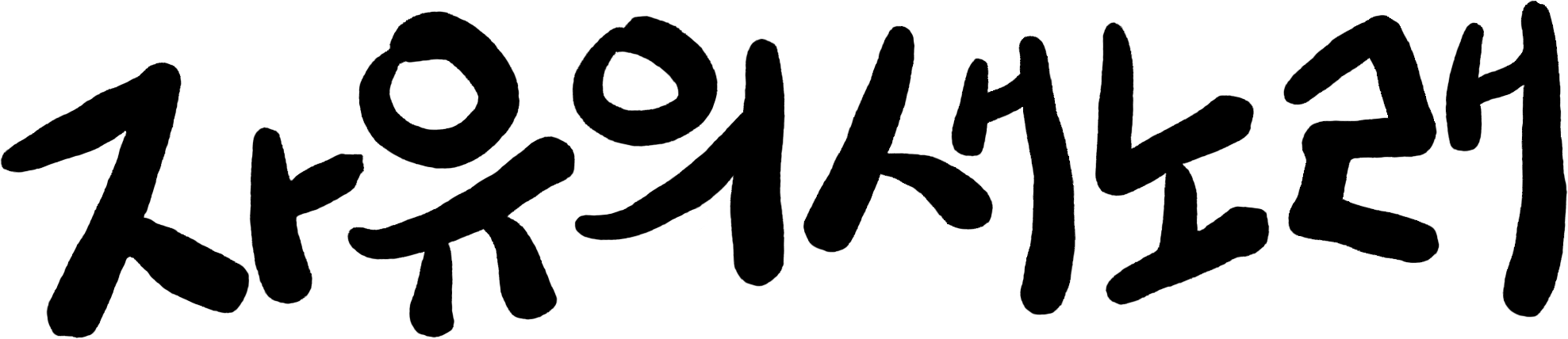레코딩 엔지니어 황병준의 앨범 ‘송광사 새벽예불’에 시선이 멈추었다. 2011년 발표한 이 앨범은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의 소리 풍경을 담았다. 수록된 시간만 1시간 14분 30초. 새벽 3시,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둠의 포문을 여는 듯했다. 법고(法鼓)를 두드리는 스님의 굳세고 힘찬 타격과, 경전을 읊조리는 새벽 독경은 내가 듣던 출근길 주파수에 비하면 차원이 달랐다. 음원은 도량석부터 새벽종송, 법고, 범종 등으로 이뤄지며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읊음으로써 막을 내린다.
황 씨는 녹음을 위해 송광사의 주지 스님과 학감 스님, 총무 스님 등 열 분을 만났다고 한다. 두 차례나 거절당한 직후였다. 예불 음반이 나왔는데 또 만드냐는 거절을 들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녹음한 교회음악을 틀었더니 스님들의 표정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도 새로 해야겠네.” 예불을 녹음하고도 20년이 지났으니, 발전된 새로운 녹음 기술에 스님들도 관심을 가질 법했다. 그가 굳이 교회음악을 들려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2008년과 2011년 그래미가 선택한 남자 황병준 엔지니어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우연히 녹음 분야를 접하면서 전공을 바꾼 것이다. 부모가 교회 성가대에 몸을 담아선지, 가족들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한다. 청년 시절에는 기독노래운동 ‘뜨인돌’에서도 활동했다. 2008년 문화예술 인터뷰에서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만큼 완전히 혼신을 다했다”고 고백했다. 시간이 흘러 기독교 언론들이 너도나도 ‘예배인도자 출신’으로 치켜세운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예불을 녹음했다니. 처음에는 흥미롭게 읽은 인터뷰 자료들에게서 황병준의 녹음 철학을 가늠했다. 녹음을 하다 보면 개 짖는 소리나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풀벌레 소리는 마치 기계 소리와 같다고. 그렇다 해서 개 짖는 소리를 지울 수는 없다. 개 짖음과 음높이가 같은 소리도 지워지기 때문이다. 황병준의 언어로는 음악이 죽은 게 돼 버린다. 황병준에게 음향이란 것은 단순히 기록, 그러니까 소리를 간단히 제압하는 행위가 아니다. 공간과 영성, 시간까지 채집하는 일인 것이다. 이 녹음을 위해 그는 막막한 어둠과 영하의 추위를 견디며 고즈넉한 예불의 소리 풍경을 담아냈다. 무려 네 번이나 수행에 가까운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를 사로잡은
송광사의 소리 풍경
매일 어둠 속 울리는
수행과 고통의 예불
새벽 천년의 읊조림
황병준은 최상의 사운드를 찾기 위해 마이크 위치를 찾아 헤맸다. 예불의 무대는 서양의 객석과 달랐다. 황병준은 부처님께 드리는 예불이니 불상 있는 쪽을 객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귀 높이가 제일 좋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걸 알아냈다. 대웅전 중앙 불단에 모셔진 세 불상, 삼세불(三世佛)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가리킨다. 삼세불 앞에 마이크를 놓았다는 것은 영원의 귀에 가장 조화로운 소리를 드리고자 했다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
며칠 전 어느 목사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서 보았다. 황병준이란 이름을 거둔 채 말이다. 내용은 이렇다. 그래미상을 받은 음향 기술자가 있었는데 1000년간 전해 내려오는 새벽의 예불 소리를 녹음했다더라.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특별새벽기도 실황을 녹음해 봤더니 교회에서 수천 명 신자들의 통성기도보다 스님 한 분의 목탁과 독경에 깃든 내공을 당해내지 못하겠더라는 것이다. 나는 황 씨가 교회와 절을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말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황병준의 다양한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지난해 10월 차별금지법 저지를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였다.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는 모이자’고 외쳐댔다. 그런데 나는 왜인지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자초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광사의 소리 풍경과 무척 대조적으로 느껴진 것이다. 송광사의 새벽 예불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천년의 소리다. 부처님에게 예불을 드리는 데에도 저렇게 전심을 다하는데. 한낱 교회의 우국충정 수준이 저 모양일 뿐이니. 애국과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신념의 소리 풍경은 태극기와 지라시에 묻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황병준은 앞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기독교 정신이 결코 개인 구원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약자·민주주의·통일 운동 등을 다 아우를 수 있는데, 당시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았다. (……)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게 아니지 않나.” 야고보서엔 이런 구절이 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야고2,18)
'오피니언 > 시대성의 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대성의 창] 4년 만에 다시 ‘ㅅ’ 교회로 돌아간 이유 (0) | 2024.09.24 |
|---|---|
| [시대성의 창] 노동력 쥐어짜는 나라라면 (1) | 2023.03.16 |
| [시대성의 창] 자기에게 주는 벌 그만 받아요 (0) | 2022.09.17 |
| [시대성의 창] 난 여전히 ISTJ일 뿐이라고 (0) | 2022.09.17 |
| [시대성의 창] 지옥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 (0) | 2022.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