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 01. 22 | 수정 : 2020. 02. 05 | A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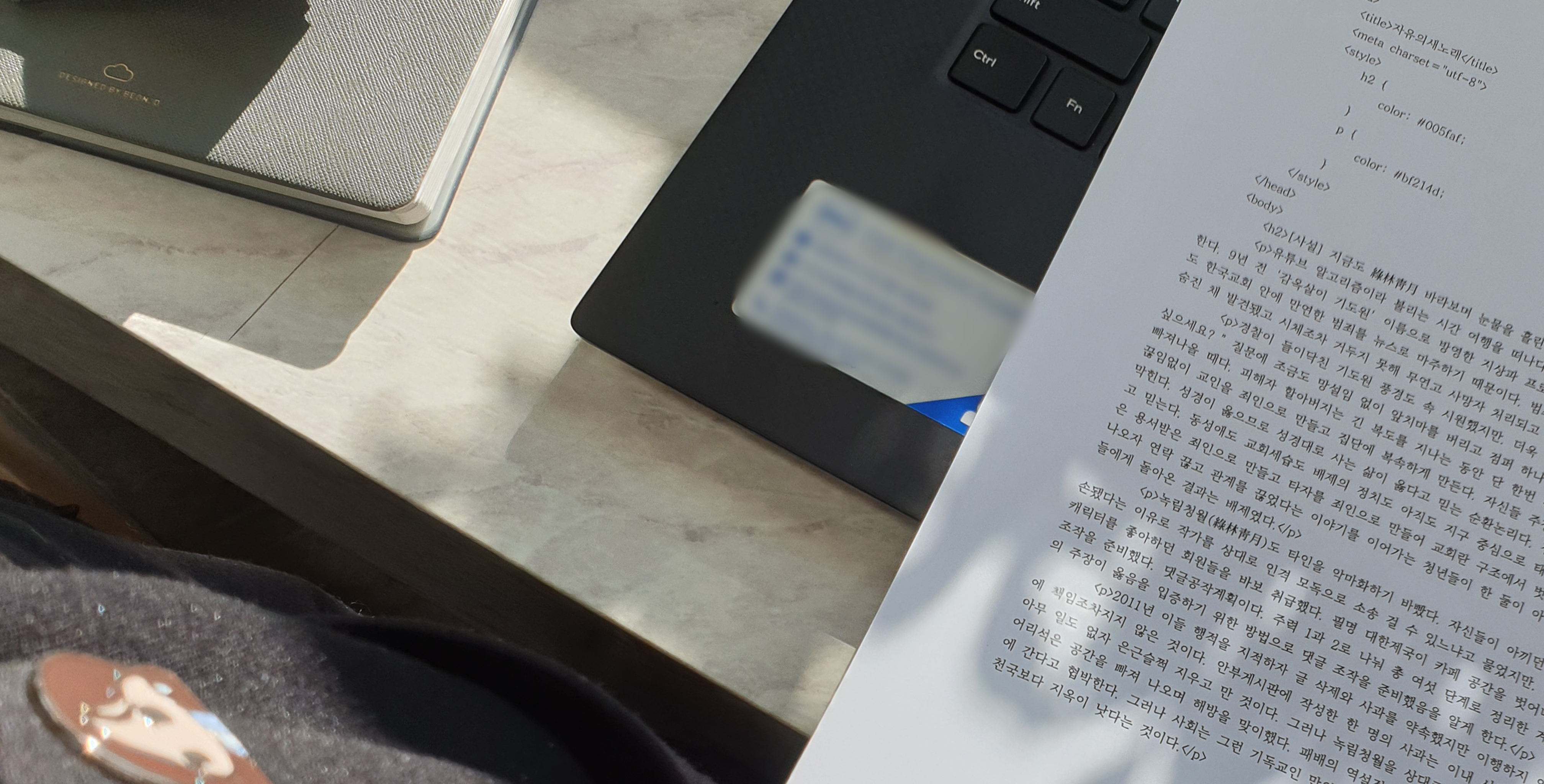
드디어 신 죽음의 시대를 벗어나려는 걸까. 신의 명령에 주목한 시대를 신 죽음의 시대 이전이라 정의한다면. 신 명령이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함을 인식한 시대를 신 죽음의 시대라 명명할 수 있다. 신 죽음의 시대는 주체성의 개념조차 존재할 수 없는 세계다. 세계라는 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대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는다.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 속에 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했건만. 신의 부활은 요원하고 세상은 바쁘게도 신의 존재를 망각한 채 신 죽음을 가리킨다. 아직도 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지만. 죽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신 죽음의 시대라는 3년의 터널을 벗어난다. 그래서 마련한 새로운 이야기가 ‘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담론’이다.
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담론은 더는 신학과 철학, 존재론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신학과 철학, 존재론이 독점한 시대의 끝에 마주했다는 의미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신교회 상황은 사회에서 바라보기 민망할 만큼 구식이다. 존재론이 지시하지 못하는 영역에 발을 담그고 스스로의 존재를 다 고민했다는 자만심도 부끄럽기 그지없다. 신학과 철학, 존재론에 대응해 신 죽음의 시대 이후 세계에 도달하자 신세계를 경험했다.
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세계는 정답에 메이지 않아도 좋다. 옳고 그름은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답이 없는 건 아니다. 무지개에 도라에몽 넣었다고 그게 올바른 과제가 아니듯. 신의 명령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대화와 소통이다. 자아-타자-세계라는 존재에 하느님이 낄 자리도 없다. 이곳은 신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붕괴된 세계다. 디자이너가 된 현대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고 만들어낸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으며 다양한 세계 속에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며 살아간다. “정답이 없다. 다만 나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조언뿐이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
감탄해 마지 아니하다
신이 죽은 세계와 다른
주체성을 가진 세계를.
그리고 나는 선언한다
신 죽음의 時代 이후를
그 세계는 선악과 이후도 없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고 언약을 세운 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세계를 구한다는 흔하디흔한 내러티브가 없다는 말이다. 소박한 ‘캔버스’ ‘도큐먼트’ ‘페이지’라 이름 지은 백지장을 펼치면, 직접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식 내러티브도, 신식 내러티브도 없다.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우리들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다. 구원도, 십자가도, 칼빈도 없다. 있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세계엔 경이로움이 가득하다. 새 레이어에 같은 소녀를 복제하고 브러쉬를 가져다 댄 채 노란색을 불어 넣고 오퍼시티(opacity) 값을 낮춰주면 따뜻한 불빛이란 생명력이 탄생한다. 누군가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해 사람을 창조해냈다고 붉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복제된 사진을 보며 이를 작품이라 감탄하고,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공감한다. 파란 풀잎 바라보며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짝지어 부른다 한들, 이 세계의 따뜻함과 비교하기 어렵다.
이 조차 세상적 삶이고, 신자유주의 병폐라는 고상한 용어를 쓴다한들 다가오는 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기 힘들다. 어차피 세상은 달라지고 바뀌어가기 때문이다. 마귀·사탄·귀신의 음모라 해도 소용없다. 신 죽음의 시대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더욱 이 세계가 경이로 다가오기보다 마귀·사탄·귀신의 굴레에 씌운 세속적 세상이란 불쾌한 감정만 남을 것이다. 이제 신이 독점하던 신 죽음의 시대조차 끝이 났다.
신 죽음의 시대를 벗어난 이들은 블락캣(bracket)을 열어 웹 사이트를 구현한다. 포토샵을 열어 사진을 보정한다. 일러스트를 열어 미지의 세계를 그린다. 인디자인을 통해 기억과 미래를 담아낸다. 프리미어를 열어 과거를 새롭게 나열한다. 새로운 시대, 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담론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나는 ‘개시(開示)의 세계’라 이름 짓고 싶다.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DOCTYPE html>
<html>
<head>
<title>자유의새노래 에셀라 시론</title>
<meta charset=”utf-8”>
<style>
.par {
color: #005faf;
}
.para {
color: #bf214d;
}
</style>
</head>
<body>
<p>드디어 신 죽음의 시대를 벗어나려는 걸까. 신의 명령에 주목한 시대를 신 죽음의 시대 이전이라 정의한다면.
신 명령이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함을 인식한 시대를 신 죽음의 시대라 명명할 수 있다.
신 죽음의 시대는 주체성의 개념조차 존재할 수 없는 세계다. 세계라는 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대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는다.</p>
<p>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 속에 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했건만. 신의 부활은 요원하고 세상은 바쁘게도
신의 존재를 망각한 채 신 죽음을 가리킨다. 아직도 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지만.
죽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신 죽음의 시대라는 3년의 터널을 벗어난다. 그래서 마련한 새로운 이야기가
‘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담론’이다.</p>
<p>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담론은 더는 신학과 철학, 존재론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신학과 철학, 존재론이 독점한 시대의 끝에 마주했다는 의미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신교회 상황은 사회에서 바라보기 민망할 만큼 구식이다. 존재론이 지시하지 못하는 영역에
발을 담그고 스스로의 존재를 다 고민했다는 자만심도 부끄럽기 그지없다.
신학과 철학, 존재론에 대응해 신 죽음의 시대 이후 세계에 도달하자 신세계를 경험했다.</p>
<p>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세계는 정답에 메이지 않아도 좋다. 옳고 그름은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답이 없는 건 아니다. 무지개에 도라에몽 넣었다고 그게 올바른 과제가 아니듯.
신의 명령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대화와 소통이다. 자아-타자-세계라는 존재에 하느님이 낄 자리도 없다.
이곳은 신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붕괴된 세계다. 디자이너가 된 현대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고 만들어낸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으며 다양한 세계 속에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며 살아간다. “정답이 없다. 다만 나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조언뿐이다.</p>
<p>그 세계는 선악과 이후도 없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고 언약을 세운 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세계를 구한다는 흔하디흔한 내러티브가 없다는 말이다. 소박한 ‘캔버스’
‘도큐먼트’ ‘페이지’라 이름 지은 백지장을 펼치면, 직접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 여기에는 구식 내러티브도,
신식 내러티브도 없다.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우리들 이야기를 담아 낼 수 있다. 구원도, 십자가도, 칼빈도 없다.
있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p>
<p>그 세계엔 경이로움이 가득하다. 새 레이어에 같은 소녀를 복제하고 브러쉬를 가져다 댄 채 노란색을
불어 넣고 오퍼시티(opacity) 값을 낮춰주면 따뜻한 불빛이란 생명력이 탄생한다.
누군가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해 사람을 창조해냈다고 붉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복제된 사진을 보며 이를 작품이라 감탄하고,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공감한다. 파란 풀잎 바라보며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짝지어 부른다 한들, 이 세계의 따뜻함과 비교하기 어렵다.</p>
<p>이 조차 세상적 삶이고, 신자유주의 병폐라는 고상한 용어를 쓴다한들 다가오는 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기 힘들다. 어차피 세상은 달라지고 바뀌어가기 때문이다. 마귀·사탄·귀신의 음모라 해도 소용없다.
신 죽음의 시대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더욱 이 세계가 경이로 다가오기보다 마귀·사탄·귀신의 굴레에
씌운 세속적 세상이란 불쾌한 감정만 남을 것이다. 이제 신이 독점하던 신 죽음의 시대조차 끝이 났다.</p>
<p>신 죽음의 시대를 벗어난 이들은 블락캣(bracket)을 열어 웹 사이트를 구현한다. 포토샵을 열어 사진을 보정한다.
일러스트를 열어 미지의 세계를 그린다. 인디자인을 통해 기억과 미래를 담아낸다. 프리미어를 열어
과거를 새롭게 나열한다. 새로운 시대, 신 죽음의 시대 이후의 담론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나는 ‘개시(開示)의 세계’라 이름 짓고 싶다.</p>
</body>
</html>
|
'오피니언 > 에셀라 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셀라 시론] “다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0) | 2020.07.04 |
|---|---|
| [에셀라 시론] 부끄러움의 해방적 역할 (0) | 2020.05.10 |
| [에셀라 시론] 최진리를 기억하며, (0) | 2019.10.15 |
| [에셀라 시론] 밤하늘에 덮인 니고데모의 얼굴 (0) | 2019.01.05 |
| [에셀라 시론] 아이히만에게 말하지 않은 죄 (0) | 2018.07.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