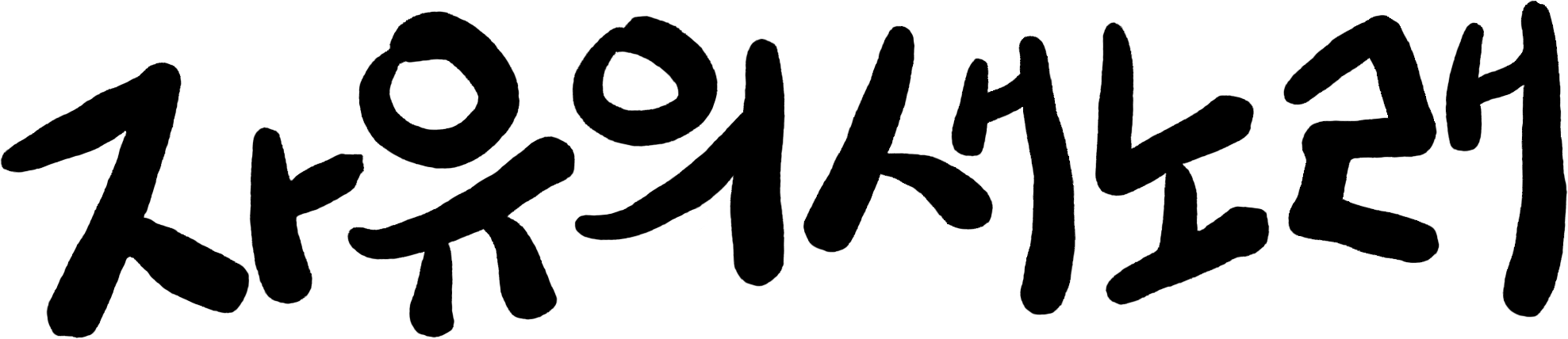조전혁 씨가 유포한 ‘전교조 명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당시 감정이 이 신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다니”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 나는 조선일보를 읽기 시작했다. 정치 성향과 역사관은 보수, 그러니까 우파에 맞춰질 운명이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면서 어떻게 경선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혔다.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이 무척 낯설게 다가왔다.
이 와중에 전교조 명단은 나의 애국심에 불을 지폈다. 당시 신문은 기록한다. “이번 사태는 전교조가 종북좌파이자 이적단체로까지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일파만파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나를 가르치던 꽤 많은 선생님이 전교조 소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실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전교조 선생님들은 지금의 2030 남자들이 느낀 이미지와는 달랐다. 왜곡된 정치 이념, 치우친 역사관, 개똥 철학을 가르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 칠판 지우던 수학 선생님, 안치환 시인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좋아하던 영어 선생님, 매 수업 시간 전 명상하면 건빵을 나눠주시던 도덕 선생님, 끽해 봐야 “조선일보는 가진 자의 신문 같다”던 소신을 밝힌 국어 선생님의 발언 정도가 전부였다.
내가 기억하려는 윤리 선생님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르치던 과목에 충실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윤리 선생님
전교조 명단에서 본
당신의 유려한 이름
내가 드린 벚꽃조차
소중히 생각하던 분
나와 다른 견해에도
햇볕정책과 성소수자
민감한 질문에 소신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립고, 보고싶은
반항하는 아이까지
말없이 잡아주시던
선생님의 연약한 손
2012년, 스승의 날을 맞아 교내 운동장에서 행사가 열렸다. 마지못해 바깥으로 나온 선생님도 있었지만 머리에 흩날리던 벚꽃을 주워다가 귀에 꽂으면서 즐기는 선생님들도 보았다. 우리 학교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 벚꽃이 교정에 꽃길을 만들었다. 나는 길을 걷다 어쩌다가 꺾이고 만 벚나무 일부를 발견했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주웠다. 버리기엔 예쁘고 가져가기엔 보관할 데가 없는 게 흠이었다.
생각 없이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던 선생님에게 벚나무 일부를 드렸다. 무척 고마워하는 선생님의 미소에 조금 당황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린 나뭇가지일 뿐인데 어쩌다 꽃 선물을 드리게 된 것이다. 한 번 더 놀란 것은 선생님이 계신 교무실에서였다. 3학년 교무실은 1층의 큰 교무실과 달리 다소 공간이 협소하다. 네 명의 선생님이 일하던 가장자리에 윤리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꽃 선물을 드리던 날 옆자리 선생님에게 용무가 있어 찾아뵌 일이 있었다. 선생님 자리에 올려진 종이컵 안에는 벚나무가 세워져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린 선물에 조금의 감동이 밀려왔다. 교무실에서 꽂혀 있던 벚나무 가지를 본 이후, 선생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선생님은 일상에서 벌어진 다소 다른 존재들을 존중하는 그런 분이었다. 언젠가 내 친구가 민머리를 한 채 나타났을 때도 그랬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그때, 물어보려 해도 나는 물어보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아쉬웠다. 녀석의 담임은 윤리 선생님이었다. 훗날 은석이와 다시 가까워졌을 때 은연 중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말야, 민머리였을 시절에 선생님이 뭐라 안 하시든? 딱히. 내가 반항하는 줄 알았는지 안 건드리던데.
수업을 가르치던 어느 날 성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일이 있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성소수자 문제에 기독교적 견해를 가지던 녀석이 찾아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모습이 생생하다. 기억을 가다듬어 보면 ‘선천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고대부터 동성애가 존재했느냐’ 등의 질문이었던 것 같다. 선생님의 대답을 분명히 듣지는 못했다. 동성애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내용인 것만은 분명했다.
이 신문도 명백히 보도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학생과의 대화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햇볕정책과 김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길게 멀리 봐야 하는 정책을 가지고 가타부타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사춘기 소년들을 마주 해야 하는 선생님의 고된 하루가 엿보였다. 더운 여름, 어두컴컴한 교실로 들어와 “커튼 좀 쳐라, 귀신아!” 지쳐 잠 들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며 “그만 자라 귀신아!”라고 외치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립다. 때론 녀석들이 반항해도 잡아주는, 선생님의 연약한 손길을 떠올려 볼 때마다 나도 어른이 되어가고, 나이를 먹는다는 게 아득해진다.
졸업 후, 근처 시립 도서관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다. 무척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선생님을 우연히 마주했다. 환한 미소로, 반갑게 내 이름을 부르던 선생님이 무척 보고 싶다.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녀의 이름으로②] 예고 없이 다가온 ‘신의 죽음’… 그의 대침묵이 이끈 기독 담론의 끝 (0) | 2026.01.17 |
|---|---|
| [소녀의 이름으로①] 죽음의 네 화살과 신앙의 해방… 탈교의 끝에는 소녀가 있었다 (1) | 2026.01.17 |
| [건조한 기억모음⑤] [2] 똥 팬티 세탁에 매일 청소까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1) | 2024.12.14 |
| [건조한 기억모음⑤] [1] “그날의 주먹, 용서할게요”… 다시 만난 형은 무릎을 꿇었다 (2) | 2024.12.14 |
| [고마운 이름들⑥] 그 시절 누나에게 교회는 ‘마지막 등불’ (3)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