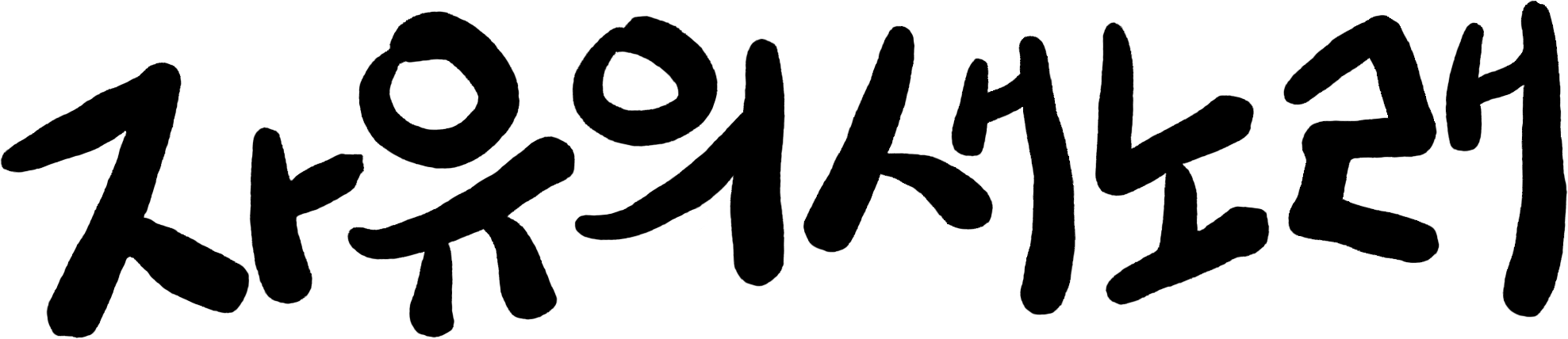세계의 주인
윤가은 감독 | 119분 | 12세+ | 2025
십여 분이었을까. 조금은 과장돼 보이는, 그래서 어색하고도 낯익은 주변 사람들의 웃음과 주인공의 미소. 아버지는 없지만 단란해 보이는 가족과 학교를 날아다니는 여고생 주인. 영화 초반, 오랜 시간 평범한 모습에 할애하던 감독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스포일러 주의 성범죄 폭력성 주의 담임 교사가 건넨 농익은 사과에 호흡이 곤란한 척 너스레를 떠는 장난까지는 우연인 줄 알았다. 성범죄자 퇴거를 주장하며 사실상 서명을 강요하던 동급생 장수호(배우 김정식) 앞에서 버럭 소리 지르는, 그러니까 “나도 성폭력 피해자야”라는 섬뜩한 장면에서 나는 ‘도무지 농담일 리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장면은 두 컷이었다. 엄마에게 “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하는 데에서 흠칫했고 남자친구 찬우(배우 김예창)와의 딥 키스에서 머문 진도는 앞으로 터질 긴장감을 미리 감지해야 했다. 주인이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라 어쩌면 친족 간의 성범죄에 노출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말이다.

태권도와 릴스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활발한 여고생 이주인
멈춰버린 시간과 ‘살아 있음’
말하기 전까진 몰랐다
과거 소녀에게 벌어진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
한국 사회의 축소판? 그러나
망가지지 않은 주인공과
범죄의 재현을 거부하며
피해 이후의 삶을 드러낸
우리 시선과 회복의 선언
◇결코 망가지지 않은 이주인
주인공 이주인은 태권도를 좋아한다. 되고 싶은 꿈은 없지만, 어머니가 없는 집안에서 남동생과 빨래, 청소를 분담할 줄 아는 성실한 딸이다. 학교에서는 엽기적인 릴스를 찍으며 친구들과 놀기도 한다. 산부인과 다녀온 이야기도 서슴없이 말했고, 큰 목소리로 탐폰과 생리통에 대해 떠들어 대기도 한다. 때론 야한 만화를 그리는 단짝 친구 공유라(배우 강채윤)와 성관계에 대한 농담도 주고받는다. 가끔은 장난치느라 두 번이나 지나가던 동급생을 치기도 했고, 그게 과해지면 남자 애한테 헤드록을 당하기도 하는 발랄한 여고생이다.
그런 주인이가 수호와 맞붙은 사건이 벌어졌다. 성범죄자 퇴거 서명 운동이 발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유아였다. 비슷한 나이의 여동생을 둔 수호가 학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서명 운동을 받는 건 당연했다. 수호는 성범죄자를 퇴거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척 단정적인 문장을 덧붙였다.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인생을 망가뜨린다.” 주인이는 확실하고 분명한 어조로 수호에게 거절한다. “이건 틀린 문장이야.”
◇초침을 움직이려는 ‘피해자 이후의 삶’
며칠 후 사과 주스와 서명안을 들이민 수호는 다시 한번 주인에게 서명을 부탁한다. 그러나 주인은 앞선 문장을 빼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논쟁에 휩싸인다. 끝내 수호의 말 “네가 당해 보라”던 한 마디에 식판까지 던지며 온몸으로 덤벼든 주인은 끝내 교사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만다. “나도 과거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인의 고백과 함께 수호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 이주인이 아니라, 피해 이후를 살아가는 인간 이주인의 정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정황은 피해자가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오해를 처참히 무너뜨린다.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 날, 주인은 저녁까지 엄마와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세차를 하기 위해 시동을 끈 차. 덤덤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바깥에서 쏟아지는 고압 물줄기처럼 주인은 통곡한다. 엄마를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장면에서 나는 원통한 마음을 푸는 해원(解冤)이 아니라 균열된 자아에서 피어나는 ‘살아 있음’을 발견했다.
피해자 이주인의 시간은 멈춰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떡해서든 초침을 움직이려 애를 쓰는, 피해자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주인의 무거운 짐을 나는 보았다.

◇피해자 이후의 삶을 사는 이를 대하는 방법
우리는 언제나 묻는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겪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나는 잠깐의 정답을 단짝 유라의 태도에서 발견했다. 있는 듯, 없는 듯하던 유라는 세간에 알려진 주인의 소문을 접하고 태도를 달리한다. 아무렇지 않게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묻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듯 “나 진짜 괜찮아”라고 말하는 주인의 질문에 다시 한번 묻는다.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주인은 쉽게 자신의 괜찮은 상태를 단정 짓지 못했다.
그럼에도 유라는 주인에게 잠시 멀어졌으나, 다시 가까워졌다. 영화는 유라와 주인이가 가까워진 배경을 굳이 에둘러 말하지 않는다. 때론 오해와 곡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듯 유라는 다시 예전처럼 주인이를 대한다. 스마트폰에 주인이의 걸음걸이를 담아내려는 건, 관객의 시선이 화면을 뚫고 일상으로 건너온 주인이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감독의 시선과 윤리
감독은 영화를 통해 주인이를 망가지고 부서진 영혼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범죄의 심각성을 재현이라는 방법을 통해 묘사하지도 않았다. 인물들을 한국 사회의 축소판처럼 배치했다. 주인이를 몰래 씹고 다니는 남자애들, 과도하지만 충분히 주인을 걱정해 주는 여자애들, 피해자들의 연대, 태권도 관장의 너그러움, 성범죄자마저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유튜버들. 그럼에도 주인은 누군가에게 살아갈 희망을 안겨 준다. 주인에게 도달한 마지막 쪽지가 불완전한 세계에서 불완전한 감각으로 잘 살아갈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문화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일랜드… 날 바꾼 건, 前남친도 前직장도 아니었어: 「미나씨, 또 프사 바뀌었네요?」 (0) | 2026.01.17 |
|---|---|
| 시각, 청각, 후각, 촉각, 환희… 헤이맨의 ‘블랙 스테이지’: 「STAGE 100」 (1) | 2025.12.26 |
| 고추잠자리가 만든 작은 봄의 역습: 「MZ를 찾아서」 (0) | 2025.03.30 |
|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너에게 전해줄 마지막 멜로디: ‘그래도 돼’ (7) | 2024.10.25 |
| 퇴사 후, 아들과 함께 푸드트럭 타고 ‘맛있는 여행길’:「아메리칸 셰프」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