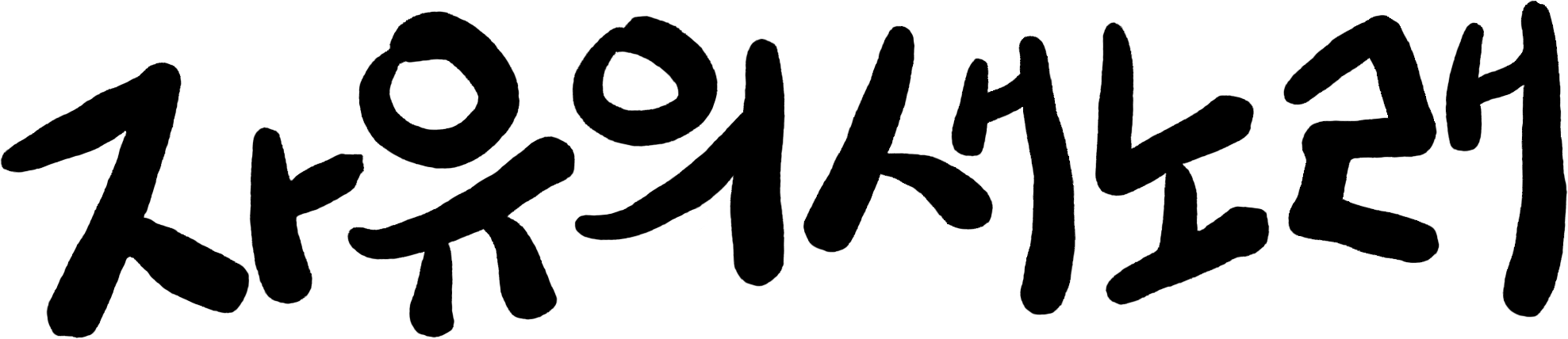구약, 타나크, 신약 ─ 마침내 성경
염진호 지음 | 문장공방 | 164쪽 | 1만1000원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경전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신이 모세에게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든지, 급하게 기록물을 모아다가 ‘신의 말씀’으로 편집했다고 보든지 말이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한순간에, 한곳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성서는 단순히 역사적 타임라인이나 교리식 공부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주입식 암기 중심의 교리 공부만으로는 구원의 다층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성서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교리로 이해되지 않는다.”(11쪽4단) 성서는 도서관처럼 다양한 장르와 층위의 해석이 공존하는 문헌이다. 따라서 지은이는 ‘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주목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화된 성서
성서의 편집 과정을 역사적으로 훑어보면 꽤 유연한 문헌이다. 이슬람의 코란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코란은 성서와 달리 중앙집권적 체계를 통해 편찬되고 유통되어왔다. 따라서 하나의 조직이 단일한 결정으로 경전을 확립할 수 있었다. 성서는 수 세기에 걸쳐 구전과 기록, 편집, 번역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구약은 기원전 5세기인 에스라 시대 이후 유대교 공동체 속에서 정립되었고 율법과 예언서, 성문서인 타나크로 확립됐다. 신약은 바울 서신과 복음서가 점차 권위를 얻으며 마르키온 논쟁 등 이단 대응 속에서 4세기 교회 공의회를 통해 27권이 확정됐다.
따라서 지은이는 성서가 코란처럼 ‘창조’되기보다 천천히 ‘진화’됐다는 점에서 공동의 산물로 보고 있다.

◇자유로운 첨삭과 편집의 전통 속에서 태어난 성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모세 사후의 기록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더디오의 첨언을 보면 성서의 후대 수정이 자연스러웠다. 지은이는 오히려 ‘후대의 자유로운 편집’에 주목한다. “성서 시대의 문서 전승은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빼곡히 적어 낸 깜지처럼 ‘있는 그대로 글을 옮겨 쓰는 작업’이 아니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시기의 글쓰기에는 후대의 첨삭과 편집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21,3)
사해사본과 사마리아 오경, 70인역(LXX) 등 다양한 버전이 병존했으며 각 공동체의 신학과 상황이 반영됐다. 바로 이 ‘성서의 변형’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 성서 곳곳에도 다양한 성서의 문헌이 가져온 “분열된 시대의 현실”(47,5)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성서의 변형은 오히려 성서 시대의 정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층적인 전승 구조를 가늠하게 한다.
◇역사적·신학적 논쟁의 산물 ‘정경화 과정’과 성서 복원의 역사
구약에서는 아가서와 전도서, 에스더서 등의 편입 여부가 논란이 됐다. 신약은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서신 등이 논의 대상이었고 정경화 과정에서 ‘헤르마스의 목자’와 ‘디다케’ 등은 제외됐다. 지은이는 구약과 신약의 정경화 과정을 설명하며 정경에 포함된 책과 정경에서 빠진 책을 설명한다.
복음서는 네 권으로 고정되었으나 서로 다른 관점과 불일치를 그대로 인정했다. 지은이는 어째서 네 권의 복음서가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대한다.
이어 지은이는 성서를 복원하려는 종교계의 노력을 정리했다. 유대교는 마소라 학파가 본문을 정리해 ‘마소라 본문(MT)’을 확립했으며 가톨릭은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표준으로 삼았고 개신교는 종교개혁 시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39권의 구약을 채택했다. 오늘날은 BHS(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등을 기반으로 원문을 복원하고 있다.
불러준 대로 쓴 신의 말씀?
“다양한 장르 층위의 해석”
성서에 담긴 역사의 흔적
고스란히 담은 분열의 시대
중앙집권 이슬람과는 달리
토론과 숙의 거치며 형성
다층적 전승 구조 내보여
각 교회별 복원에도 눈길
공동의 산물 들여다보니…
정통이 먼저 만들어졌다?
“이단 대응하려다 정경화”
형성사에서 발견한 역설
◇성서 정경화의 역설적 풍경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정통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서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반대였다는 사실을 마주한다. 신약 성서는 마르키온의 정경화 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은이는 설명한다. “성서가 때로는 이단에 맞서기 위한 대응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 성서인 타나크는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103,3)
이단의 등장 때문에 오히려 성서를 정경으로 정립하고 확정 짓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방향을 일러주기엔 좋지만,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방대한 연구 성과와 학자 인용을 바탕으로 해 학술적 신뢰성이 높다. 구약과 신약, 정경 형성 과정의 복잡한 맥락을 잘 정리해 일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독자를 의식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본문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부합하는 본문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합리적인 길잡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짧게 줄인 본문에도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성서가 필요 없는 시대에 “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재성을 두고 고민했더라면 어땠을까. 신학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책이다.
'문화 >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문이 ‘큐레이터’라고? 건방 떨지 마라:『세상을 편집하라』 (0) | 2025.11.20 |
|---|---|
| [이야기 꿰매며] 문장의 힘에서 느낀 문장의 모순과 자책 (1) | 2024.12.10 |
| 제목에 심어놓은 ‘조선일보의 의도’ 편집자의 윤리를 묻는다:『이런 제목 어때요?』 (2) | 2024.12.10 |
| 아파도 견뎌야 했어… 아빠의 작은 희망:『나의 슈퍼히어로 뽑기맨』 (3) | 2024.12.10 |
| 좁은 사고방식의 그런 지구, 정복할 이유라도?:『우리 미나리 좀 챙겨 주세요』 (1)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