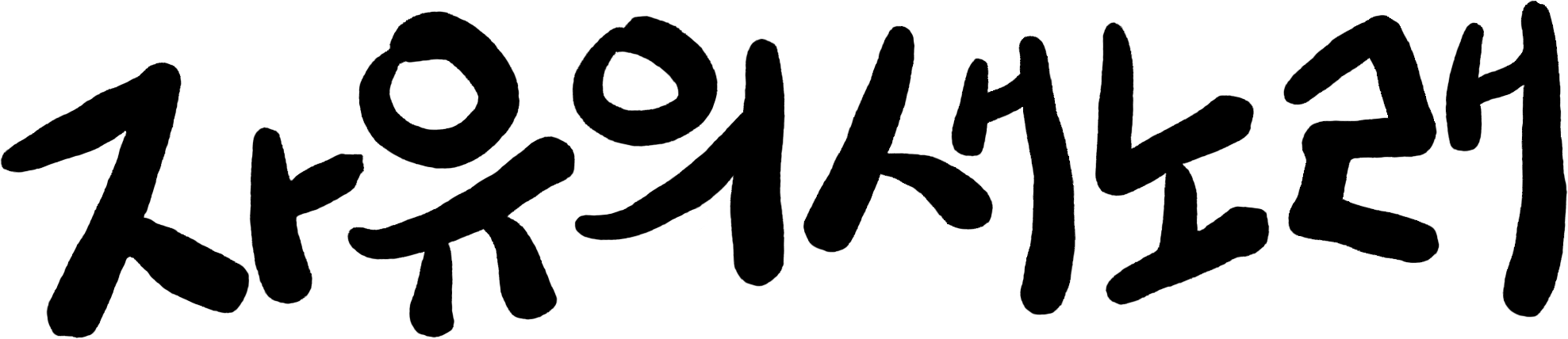잔나비의 정규 4집 Sound of Music pt.1 수록곡 ‘무지개’에는 비장한 제목이 붙어 있다. ‘모든 소년 소녀들2’. 그 뮤직비디오에서 나는 서글픈 직감에 사로잡혔다. 바닥에 쓰러진 채 날지 못하는, 새의 형상을 한 인간. 그리고 멀찍이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이들이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망원경인지 요지경인지 알 수 없는 쌍안경을 들고, 그들은 하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코 날 수 없는 이의 날갯짓은 외로워 보였다. 정장을 입은 다수의 사람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그 몸짓은 이룰 수 없는 ‘시궁창에서 별 바라보기’ 같았다.
‘무지개’는 앞선 곡 ‘모든 소년 소녀들 1 : 버드맨’의 연작처럼 들린다. 두 개의 뮤비가 말없이 이어지며 메시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말끔한 교복을 입고 졸업 사진을 찍는 소녀와 소년들. 미래를 약속받은 듯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아가는 희망에 찬 장면들. 그러나 제목이 가리키듯, 버드맨은 아기새를 의미한다. 갓날개를 펴고 꿈을 향해 발버둥치는 존재. 그리고 그 꿈은 결국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저 너머의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운명으로 귀결된다. 이룰 수 없는 꿈, 닿을 수 없는 이상. 버드맨은 그렇게 다수가 되는 법을 배운다.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는 올해가 가기 전 글을 쓰기로 다짐했다. 이 직감을 기록할 수 있다면 언제가 되었든 글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더욱 글로 남기고 싶은 강렬한 불꽃이 타오른 것은 가난 선생님과 헤어질 무렵이었다. 가난 선생님과 가까워진 건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완전히 완수하고 떠난 후였다. 회사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편집한 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게 가난 선생님과 나의 주 업무였다. 때로는 내가 보조로 촬영을 도와드리기도 했고 내가 가난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얼굴을 마주한 지 3일 만에 통성명을 했다. 가끔은 한국어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선지 내 이름을 잊어버리곤 했다. 하지만 가난 선생님은 유능한 통역 업무로 나를 놀라게 했다. 본사 직원이 아닌 대행사 직원임에도 내게도 따뜻하게 대해준 노동자였다.
가난 선생님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자신의 일처럼 회사를 대했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화사했고, 당찬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일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인지 알고 싶었다. 그 노력을 임원들이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원체 세상은 무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선한 마음의 가난 선생님은 두 번이나 내 앞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다. 이놈 회사는 당신에게 속상한 대우로 가슴을 아프게 만든 것이다. 어느 날은 축 늘어져 의자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가난 선생님 옆에서 앉아만 있어야 했다.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고생했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뿐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난 선생님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일뿐이었다. 송구스럽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정 그것뿐이었다.
무소불위 ‘돈과 권력’
세상을 쥐락펴락해도
삶의 토대 이루는 건
이름 없는 이들의 땀
당신의 이름에 담긴
그 고귀한 의미처럼
묵묵히 견디고 견뎌
한없이 열린 이 세상
화사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 나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원래 나의 퇴사 기사에는 이곳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풀어갈 생각이었다. 사무실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내가 속상했던 순간들, 화가 났던 기억들. 그것들을 남겨 놓기로 마음 먹었었다. 말 없이 문장을 쌓고, 쌓다 보니 이상하게도 사건은 사라졌고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가난 선생님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옆에서 묵묵히 버텨준 다른 통역사 선생님들의 얼굴도 떠올리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일’을 기록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함께 견뎌낸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가난 선생님을 통해 변해가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나는 보았다. 묵묵히 일하는 자의 항상성(恒常性). 웃음이 났다. 그 항상성은 가벼운 토대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변하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랑, 정의 같은 추상적 가치나 개념 따위만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이 비참한 사회를 흐름잡고 있는 건 돈의 가치, 힘의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런 굵은 권능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 때 삶의 토대를 이루는 이름 없는 것들이 항상성을 만들 수 있겠구나를 깨달은 것이다. 마침내 원고를 마감하다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공동체성과 과거의 전통, 사랑에 스며든 고귀한 희생 정신을 잃은 채 그저 삶에 치여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돈에 절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뮤직비디오에서 느낀 서글픈 직감은 내게 청춘을 가리켰다. 사회의 모순을 견뎌야만 하는, 끝내 꿈을 간직한 채 살아내야 하는 방황의 다른 이름 말이다. 동시에 나는 또 다른 청춘의 이름 가난(佳楠)을 통해 아름답고, 훌륭하며, 고귀한 성품의 나무와 같은 항상성을 깨달았다. 비록 꿈을 꾸는 자 버드맨이 쓰러져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시퀀스에 담긴, 버드맨의 시선을 방황하는 이름의 청춘들이 따라 바라보는 장면처럼. 끝끝내 일어나 허상의 하늘을 바라보는 청춘들을 향해 날갯짓을 펼치며 함께 살아가자고, 지금의 현실은 시궁창일지라도 별을 바라보자고. 그럼에도 세상은 견디고 또 견디는 자에게 한없이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나는 믿는다.
'오피니언 > 에셀라 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셀라 시론] 파수꾼의 마지막 등불 (1) | 2024.09.07 |
|---|---|
| [에셀라 시론] 유랑하는 너의 삶에게 보내는 찬사 (1) | 2024.03.19 |
| [에셀라 시론] 잘 지내, 퍼피레드 (1) | 2023.12.07 |
| [에셀라 시론] 전임자와 탄핵 (0) | 2022.12.17 |
| [에셀라 시론] 아기새는 날개를 펴 날았을까 (0) | 2022.10.27 |